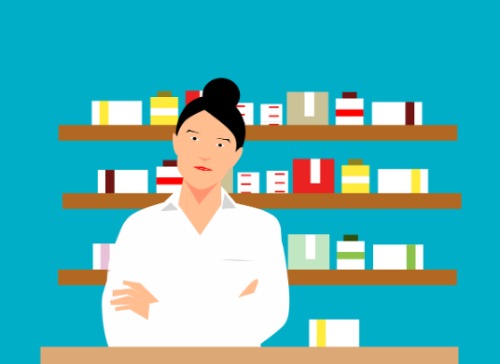티스토리 뷰

항암제 개발에서 콤비네이션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 종양 내 이질성, 내성 회피, 면역 환경 변화 등 단일 타깃 기반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두 가지(혹은 세 가지) 이상의 경로를 동시에 건드리는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는 무한한 조합 가능성 속에서 어떤 조합이 실제로 시너지를 내는지, 어떤 조합은 오히려 독성을 키우는지, 무엇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최근 몇 년간 분석팀에서는 전사체(transcriptome)와 대사체(metabolome)를 통합적으로 읽어서 세포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쓰고 있는지, 어떤 병목을 겪고 있는지, 어떤 신호전달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복구되는지를 파악해 콤비네이션 전략을 재설계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전사체는 “세포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청사진이고, 대사체는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화학적 스냅샷이다. 두 정보를 동시에 읽으면 약물 반응성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조합 약물 투여 시 어떤 방향으로 대사가 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1) 왜 transcriptome–metabolome 연계 분석이 콤비네이션 치료 최적화에 유용한지, 2) 실제 분석 설계 전략, 3) 항암제 케이스 기반의 실전형 해석 예시, 4) 국내 제약사 관점의 개발 전략까지 정리해본다.
1. 왜 transcriptome–metabolome 연계 분석인가?
1-1. 전사체만 보면 생화학적 reality가 빠진다
RNA-seq을 보면 특정 pathway가 up/down되는 패턴을 쉽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다:
- mRNA 증가 ≠ 단백질 증가
- 단백질 증가 ≠ 효소 활성 증가
- 효소 활성 증가 ≠ 대사 플럭스 증가
특히 암세포에서는 전사체 패턴이 실제 대사 흐름과 역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예: 저산소 환경에서 HIF-1α가 glycolysis 관련 유전자를 upregulate 하지만, ROS 축적이나 NAD+/NADH 불균형 때문에 실제 glycolytic flux가 늘지 않는 케이스.
따라서 전사체만으로 “약물 반응성”을 논하면 필연적으로 오판이 생긴다.
1-2. metabolomics만 보면 upstream regulatory logic이 빠진다
대사체는 현상을 잘 보여주지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력이 부족하다.
예: TCA cycle 중간체가 감소했다면
- PDH 억제 때문인지
- mitochondrial ROS 증가 때문인지
- glutamine anaplerosis 저하 때문인지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다.
여기에 transcriptome을 얹으면 upstream 조절자까지 추적할 수 있다.
1-3. 두 데이터셋을 correlation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숨겨진 조합 타깃’이 드러난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조합 약물의 second-hit 타깃이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두 약물을 섞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pathway를 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전사체–대사체 상관 분석을 하면 다음 정보들이 명확하게 보인다:
- 특정 유전자 발현 변화가 어떤 대사체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 대사 병목(bottleneck)이 전사체 기반에서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 resistance marker가 pathway 레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 first drug 투여 후 드러나는 취약점(vulnerability)을 두 번째 약물이 찌를 수 있는지
이 정보가 바로 콤비네이션 전략의 과학적 근거가 된다.
2. Transcriptome–metabolome 연계 분석 전략
2-1. 샘플링 타임포인트 전략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 축(time-course design)이다.
약물 반응은 단계적으로 변한다:
- 0–6h 초기 반응: signal transduction, transcription factor 변화
- 6–24h 중기 반응: 대사 조절, 에너지 스트레스 대응
- 24–72h 후기 반응: apoptosis, autophagy, DNA repair, ROS 조절
전사체는 빠르게 변하고, 대사체는 비교적 느리게 반영된다.
따라서 두 데이터를 correlation 하려면 중첩되는 시점을 잡아야 한다.
실제 제약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조합:
- 0h baseline
- 4–6h (transcriptional signaling peak)
- 12–24h (metabolic reprogramming 발생 시점)
- 48h (phenotypic commitment 시점)
2-2. LC-MS/MS 기반 metabolomics 분석 workflow
분석팀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다:
- 시료 quenching 속도
- polar metabolite coverage
특히 glycolysis·TCA·PPP 관련 대사체는 turnover rate이 매우 빠르므로,
quenching을 0.5~1초 안에 끝내지 않으면 데이터가 왜곡된다.
실무적으로는:
- cold 80% MeOH quenching
- centrifugation at -9°C
- HILIC-LC-MS/MS 기반 분석
- NAD+/NADH, ATP/ADP는 별도 extraction 필요
- isotopically-labeled standards 활용으로 batch effect 최소화
2-3. Transcriptome–metabolome 연계 분석 방법
다음 네 가지 분석 전략이 가장 자주 사용된다:
1) Pairwise correlation network (Pearson/Spearman)
- 유전자–대사체 간 연결성을 시각화
- pathway-level clustering 가능
2) Multi-omics regression models (PLS, O2PLS, mixOmics)
- 어떤 유전자가 어떤 대사체 변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지 해석 쉬움
3) Joint pathway analysis
- KEGG, Reactome 등에서 전사체·대사체를 동시에 매핑
- combination target 후보 빠르게 식별 가능
4) Graph-based causal inference
- Drug A → TF activation → metabolic shift → vulnerability
- 이런 causal chain을 추적 가능
특히 combination therapy 연구에서는 vulnerability node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3. 실제 항암제 케이스 기반 해석 예시
3-1. EGFR inhibitor + metabolic inhibitor 조합
문제 상황
EGFR inhibitor(gefitinib, osimertinib 등)에 내성을 보이는 세포는
전사체 분석 시 oxidative phosphorylation(OXPHOS)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패턴을 자주 보인다.
하지만 실제 metabolomics 데이터를 보면:
- TCA 중간체 증가
- mitochondrial NAD+/NADH 비 감소
- FAO 증가
즉 EGFR 억제 이후 세포는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과활성화해 생존을 유지한다.
combination 전략
이 데이터는 “OXPHOS inhibitor(예: phenformin)”와의 조합이
전사체–대사체 상에서 완벽히 타당하다는 근거가 된다.
실제 실험에서도 synergy index가 증가하며 apoptosis marker가 과발현됨.
3-2. PD-1 inhibitor + glycolysis blocker 조합
전사체 분석에서는 exhausted T cell에서 glycolytic gene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metabolomics는 lactate 축적과 acidic TME 특성을 보여준다.
즉 T cell 자체의 glycolysis는 억제되어 있지만,
종양과 MDSC가 lactate를 뿜어 T cell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lactate transporter 억제제(MCT1 inhibitor)를 조합하면
PD-1 저항성이 완화됨.
3-3. PARP inhibitor + NAD+ metabolism 조절제
PARP inhibitor는 DNA damage를 유도하고 NAD+ pool을 고갈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실제 대사체 데이터를 보면:
- PARP-i 처리 후 NAD+가 줄어듦
- glycolysis flux가 NAD+ 부족 때문에 감소
- 종양이 대신 serine-glycine one-carbon metabolism을 증가시키며 보상
전사체 데이터에서도 SHMT, MTHFD2 등 OCM(One-Carbon Metabolism) 유전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OCM inhibitor + PARP inhibitor” 조합은 metabolic rescue 경로를 차단하는 최적의 조합이 된다.
4. Combination therapy 최적화를 위한 Multi-omics 연구 설계 가이드
4-1. 약물 단독 → 약물 A + 약물 B 순차 테스트
- Drug A 단독 처리 → transcriptome + metabolome
- Drug B 단독 처리 → transcriptome + metabolome
- A+B 동시 처리
- 각 조건에서 correlation network 비교
특히 중요한 것은:
- Drug A 후 발생하는 vulnerability를 Drug B가 찌를 수 있는지
- Drug B에 의한 대사 독성이 A 처리 시 완화되는지
4-2. Synergy 판단 시 metabolic flux 모델 활용
LC-MS/MS 기반 steady-state metabolomics만으로는 flux 해석이 제한적이다.
가능하면 다음을 포함한다:
- 13C isotope tracing
- glycolysis 및 TCA flux 모델링
- dynamic NAD+ redox cycling 분석
이렇게 해야 조합 약물이 실제로 “대사 흐름을 어디서 조절하는지” 보인다.
4-3. Machine-learning 기반 multi-omics integration
요즘 많이 쓰는 모델:
- Random Forest feature importance
- Elastic-net regression
- XGBoost 기반 synergy score 예측
- multi-omics network embedding 모델
특히 synergy의 핵심 predictor로 자주 등장하는 대사체는 다음과 같다:
- lactate
- succinate
- fumarate
- α-KG
- serine/glycine
- acetyl-CoA
이 대사체들은 전사체 신호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
5. 국내 제약사 관점에서의 활용 전략
한국 제약사들이 multi-omics 기반 combina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쓰려면
다음 네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5-1. LC-MS/MS 기반 core metabolomics 플랫폼 내재화
외주 분석만으로는 반복 최적화가 어렵다.
특히 low-volume sample에서 고감도 분석이 필요하므로
사내 LC-MS/MS 분석팀이 주도적으로 대사체 기반 연구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5-2. Multi-omics 데이터 통합 인력 확보
필요 인력:
- 분석팀 LC-MS/MS 전문가
- RNA-seq bioinformatician
- multi-omics statistical modeler
- compound 개발팀
특히 “중간을 매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를 확보해야 multi-omics 기반 R&D가 실제로 굴러간다.
5-3. Combination therapy 후보 탐색 플랫폼 구축
국내 제약사는 이미 이중·삼중 병용 전략을 많이 고민하고 있기에
multi-omics correlation 기반 타깃 선정은 실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필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Drug A에서 과활성화되는 pathway 자동 검출
- 관련 대사 취약점 자동 추천
- Drug B 후보군 ranking
- synergy likelihood score 산출
5-4. 임상 적용
- biomarker 기반의 콤비네이션 전략 제시
- responder vs non-responder stratification
- early-phase에서 약물 실패 확률 줄이기
특히 국내는 대규모 환자 multi-omics 데이터를 아직 많이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PDX·organoid 기반 multi-omics 모델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리
Transcriptome–metabolome 연계 분석은 “조합 약물이 왜 필요한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강력한 방법이다.
전사체가 보여주는 upstream regulatory logic과, 대사체가 보여주는 biochemical reality를 결합하면
단일 데이터로는 절대 보이지 않던 vulnerability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 vulnerability가 바로 combination therapy의 핵심 타깃이다.
국내 제약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개발 속도뿐 아니라 실패 확률까지 줄일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될 것이다.
'제약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Data-dependent acquisition (DDA) vs Data-independent acquisition (DIA) (0) | 2025.11.21 |
|---|---|
| AI-assisted peak deconvolution – 복잡한 metabolomics 데이터의 자동화 해석 (0) | 2025.11.20 |
| LC-MS/MS 기반 Lipidomics 분석으로 항암제 내성 메커니즘 탐색 (0) | 2025.11.19 |
| Isotope Tracing 기반 Metabolic Flux 분석 – 종양 대사 재프로그래밍 연구 응용 (0) | 2025.11.18 |
| Proteomics + Metabolomics 통합 분석을 통한 약물 독성 메커니즘 규명 (0) | 2025.11.17 |
| Targeted metabolomics를 이용한 약물 대사 경로 규명 (0) | 2025.11.16 |
| Pharmacometabolomics로 개인 간 약물 반응성 예측 모델 구축하기 (0) | 2025.11.15 |
| Extract stability 및 bench-top stability 검증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 사례 (0) | 2025.11.1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정량분석
- 팬데믹
- AI
- 대사체분석
- 항암제
- 치료제
- 제약산업
- 디지털헬스케어
- Targeted Metabolomics
- Multi-omics
- 대사체 분석
- 머신러닝
- metabolomics
- LC-MS
- 정밀의료
- 약물개발
- 바이오의약품
- 약물분석
- 유전체분석
- 세포치료제
- Drug Repositioning
- 임상시험
- 신약개발
- 약물 반응 예측
- 제약
- 미래산업
- 면역항암제
- lc-ms/ms
- 바이오마커
- 공급망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