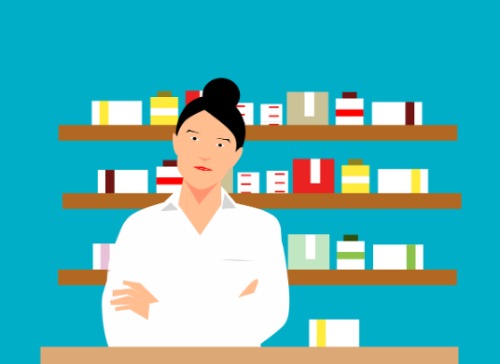티스토리 뷰
Biotransformation Metabolite Profiling – Unknown Metabolite 구조 동정 Workflow 완전 정리
pharma_info 2025. 11. 23. 20:47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후보물질이 체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밀하게 추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흔히 말하는 DMPK 연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Biotransformation, 즉 “약물이 생체 내에서 어떤 대사체로 전환되는가”를 밝히는 과정이다. 대사체의 구조를 명확히 아는 것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독성 신호, 효능, 약물 상호작용,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 대응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발 단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정보다.
특히 최근 신약들은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 라이브러리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Unknown metabolite 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 연구 현장에서 분석팀을 가장 바쁘게 만드는 지점이다.
오늘은 실제 LC-MS/MS 기반 약물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미지 대사체 구조를 어떻게 찾고, 어떤 workflow로 검증하며, 어떤 도구와 전략을 활용하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국내 제약사의 실제 연구 방식과 해외 빅파마의 접근 전략도 함께 비교하여 정리했다.
1. Biotransformation 분석의 기본 방향성
대사체 분석은 크게 Targeted와 Untargeted로 나뉘지만, unknown metabolite 연구는 당연히 Untargeted metabolite profiling로 시작한다.
여기서는 다음 질문들에 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 대사체가 몇 개 존재하는가? (global feature 탐색)
- 이 피처(feature)가 약물에서 유래한 것인가?
- Mass, MS/MS fragmentation을 기반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를 겪었는가?
- 가능한 구조 후보는 무엇인가?
- 어떤 실험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Unknown metabolite 구조 동정 workflow다.
2. Sample Preparation – Unknown metabolite 연구의 절반
(1) Matrix 선택
- 혈장(Plasma)
- 간 microsome (HLM)
- 간 S9 fraction
- Hepatocyte
- Urine, bile 등 배설 기반 매트릭스
국내 제약사의 경우 대사체 profiling의 초기 단계에서 rat hepatocyte + HLM 조합이 가장 일반적이다.
해외에서는 cryopreserved hepatocyte 의 활용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2) Extraction 전략
Unknown metabolite 분석에서는 다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 수용성 대사체까지 회수
- Artifact 생성 방지
따라서 다음 조합이 많이 사용된다:
- Protein precipitation(예: ACN 2~3배)
- SPE(HLB, Mixed-mode 등)
- Liquid–liquid extraction은 극성 대사체 손실이 있어 잘 안 쓰는 편
(3) Stability 관리
미지 대사체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다음을 반드시 체크한다.
- 분석 직전까지 4°C 보관
- DTT·BHT·Methanol 등 antioxidant/quencher 활용
- Freeze–thaw cycle 최소화(가능하면 1회 미만)
해외에서는 대사체 stability를 sample prep 단계에서 micro-sampling 기반 DBL(Deep Biological Lock)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3. LC-MS(/MS) Acquisition – Unknown metabolite의 실체를 포착하는 방법
(1) LC 조건
극성 대사체도 고려해야 하므로 2가지 접근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 Reverse Phase C18 (일반적)
- HILIC (수용성, phase II 대사체)
Phase II 대사체 (glucuronide, sulfate) 등이 중요한 경우 HILIC 병렬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MS 조건
Unknown metabolite 분석은 고해상도(Orbitrap, QTOF) 사용이 사실상 필수다.
- MS1 resolution: 60,000 이상
- MS/MS: DDA (Data-dependent) + stepped collision energy
- Fragmentation: HCD 20 / 35 / 50 eV 조합
- Polarity switching: (+) / (–) 모두 획득
→ stepped CE 적용 시 unexpected fragment가 잘 잡혀 unknown 구조 동정에 큰 도움이 된다.
(3) QC 전략
- Blank
- Pooled QC (모든 sample mixture)
- Carry-over 확인용 wash
Untargeted 분석에서는 retention time drift, mass calibration drift 등을 QC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4. 데이터 전처리 – Unknown metabolite 후보를 ‘찾아내는’ 단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연구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조합이 많이 쓰인다.
- 오픈소스: MS-DIAL, MZmine 3
- 상용: Compound Discoverer, MassHunter, Progenesis QI
Workflow
- Peak picking
- Deconvolution
- Mass alignment
- Feature table 생성
- Blank subtraction
- Drug-derived feature 추출
특히 drug-derived feature 필터링은 다음 기준을 활용한다:
- Parent drug의 accurate mass 대비 +16, +176, –2 등의 characteristic mass shift
- Isotope pattern 추적
- Drug-treated vs control 비교 시 fold-change > 5
- MS/MS similarity linking
해외 빅파마(BMS, Pfizer 등)는 in-silico reaction prediction 기반의 drug-derived feature mapping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5. Unknown Metabolite Annotation – 구조 후보를 좁혀가는 전략
Unknown 구조 동정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것이다.
(1) Mass shift 기반 추론
아주 기본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이다.
| 변화 | Mass shift | 의미 |
| 산화 | +15.9949 | hydroxylation |
| 탈수소 | –2.0157 | reduction |
| Glucuronidation | +176.0321 | UGT reaction |
| Sulfation | +79.9568 | SULT |
| Methylation | +14.0157 | CH3 attachment |
이 값들이 parent drug와 일치한다면 바로 후보를 좁힐 수 있다.
(2) Fragmentation 기반 구조 추정
MS/MS fragment를 보면 다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core 구조가 유지되는지
- 특정 ring 영역이 hydroxylation 되었는지
- glucuronide cleavage 패턴이 나타나는지
- neutral loss가 어떤 방식인지
예:
- Glucuronide는 NL 176·113·85 등이 강하게 나타남
- Sulfate는 NL 80·98
- Oxidation은 core fragment는 동일하나 mass +16 shift fragment가 나타남
국내 제약사에서는 fragment tree 분석을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다음 자동화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SIRIUS
- MetFrag
- MS-FINDER
6. 네트워크 기반 구조 동정 – 최신 트렌드
최근 가장 많이 각광받는 접근법은 Network-based annotation이다.
(1) MS/MS similarity network (GNPS 방식)
- Similar fragmentation을 갖는 미지 피처들을 군집화
- Known metabolite가 seed node 역할을 하며 unknown annotation 전파
(2) Biotransformation reaction network (KGMN 접근)
- 알려진 생화학적 반응을 기반으로 unknown candidate 자동 생성
- “Parent → M1 → M2…” 연속 반응 시나리오 모델링
(3) Peak correlation network
- 시간 경과(TI study)에서 함께 증가/감소하는 피처들을 묶어 drug-related metabolites로 분류
우리나라 연구실에서는 KGMN 방식이 아직 생소한 편
하지만 해외(UCSD, ShanghaiTech 연구팀 등)는 KGMN 기반 Unknown annotation을 점점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다.
7. Structure Validation – 진짜 구조를 확인하는 단계
후보 구조를 찾았다고 끝이 아니다.
Unknown metabolite 연구의 진짜 ‘승부’는 검증 단계다.
(1) 표준물질 합성 또는 확보
- 가능하면 candidate structure를 직접 합성하여 RT·MS/MS 비교
- 가장 확실한 방법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 제약사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2) Mirror plot 비교
Next step은 MS/MS mirror plot 비교다.
확실한 match 기준:
- fragment ion major peak 일치
- neutral loss 패턴 일치
- relative intensity 패턴이 비슷함
- RT 역시 ±0.1분 이내
(3) Stable isotope labeling
Unknown 구조 동정에 매우 강력한 보조 실험이다.
예를 들어 ^13C6-labeled parent drug를 투여하면:
- metabolite에서도 ^13C mass shift가 동일하게 이동함 → drug-derived feature임을 확정
- fragment에서 labeling position까지 추적 가능
국내에서는 흔한 방식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early stage project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략이다.
8. 최종 Interpretation – Unknown metabolite가 말해주는 것
Unknown metabolite 구조를 확인하면 이제 다음 단계는 Biological meaning을 해석하는 것이다.
(1) 독성 신호와의 연결
- Bioactivation pathway가 확인되면 reactive metabolite 여부 판단
- GSH-adduct와 연동하여 toxicity prediction 가능
(2) 효능·노출량 관련 분석
- 특정 대사체의 비율이 높으면 clearance 증가 or exposure 감소 가능성
- PK parameter와 대사 패턴 연결 분석
(3) Drug–drug interaction 예측
- UGT/SULT/CYP 대사체 분포를 통해 DDI 가능성 미리 점검
(4) 임상 TDM 적용 가능성
Metabolite가 활성을 갖는 경우 → TDM panel에 포함될 가능성 존재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TDM 플랫폼에 metabolite panel을 적극적으로 넣는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향후 스마트 TDM 시대에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9. 국내 제약사 vs 해외 빅파마 – Unknown metabolite 분석 방식 비교
| 항목 | 국내 제약사 | 해외 빅파마 |
| Sample prep | 전통적 PPA·SPE 중심 | Micro-sampling·Autosampler stabilization 더 적극적 |
| Software | MassHunter·MS-DIAL·MZmine | SIRIUS·MetFrag·KGMN 기반 annotation |
| LC 방식 | C18 기반 중심 | HILIC 병렬 사용 비율 높음 |
| Validation | 표준 합성은 예산 한계로 제한적 | 후보 구조 거의 모두 검증 |
| Reaction Network 활용 | 제한적 |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 |
10. 마무리 – Unknown metabolite 분석은 결국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
Unknown metabolite profiling은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확실히 정리되면 그 뒤의 DMPK 전략이 훨씬 명확해진다.
- 약물이 어디서 대사되는지
- 어떤 toxic risk가 있는지
- exposure를 올리기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 임상에서 어떤 monitoring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모든 것이 이 분석을 기반으로 쌓인다.
앞으로도 복잡한 구조의 신약 후보가 늘어날수록 unknown metabolite 연구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LC-MS/MS 기반 프로파일링과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분석 도구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제약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Transcriptome–metabolome 상관 분석을 통한 combination therapy 최적화 전략 (0) | 2025.11.22 |
|---|---|
| Data-dependent acquisition (DDA) vs Data-independent acquisition (DIA) (0) | 2025.11.21 |
| AI-assisted peak deconvolution – 복잡한 metabolomics 데이터의 자동화 해석 (0) | 2025.11.20 |
| LC-MS/MS 기반 Lipidomics 분석으로 항암제 내성 메커니즘 탐색 (0) | 2025.11.19 |
| Isotope Tracing 기반 Metabolic Flux 분석 – 종양 대사 재프로그래밍 연구 응용 (0) | 2025.11.18 |
| Proteomics + Metabolomics 통합 분석을 통한 약물 독성 메커니즘 규명 (0) | 2025.11.17 |
| Targeted metabolomics를 이용한 약물 대사 경로 규명 (0) | 2025.11.16 |
| Pharmacometabolomics로 개인 간 약물 반응성 예측 모델 구축하기 (0) | 2025.11.15 |
- Total
- Today
- Yesterday
- metabolomics
- 정밀의료
- 바이오의약품
- 세포치료제
- 대사체분석
- Multi-omics
- 바이오마커
- 공급망
- LC-MS
- AI
- 약물 반응 예측
- 약물분석
- 면역항암제
- lc-ms/ms
- Drug Repositioning
- 항암제
- 정량분석
- 제약산업
- 신약개발
- 디지털헬스케어
- 머신러닝
- 팬데믹
- 임상시험
- 치료제
- 미래산업
- 약물개발
- 대사체 분석
- Targeted Metabolomics
- 제약
- 유전체분석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